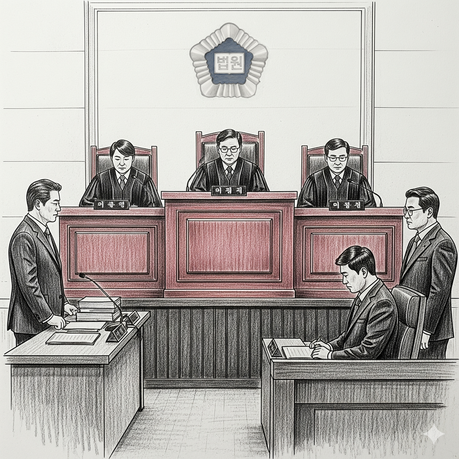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 파면됐다.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개월여 만이다.
그날 집에서 아내와 숨죽이며 TV 생방송을 시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1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발표하던 순간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누군가는 10년 먹은 체증이 싹 내려갔다고 했다. 과거 국정농단의 주역 박근혜가 탄핵되던 그 이상의 감격이었다. 검사 출신 수준 미달의 대통령이 저지른 불량 정치를 사법적으로 단죄하고 바로잡은 날이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민주주의와 국가 기강을 무참히 무너뜨린 윤에 대한 응징이었다. 윤의 불법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내내 불안과 답답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이 그제야 민주주의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에 대한 희망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돌이켜보니 지난겨울 한밤중의 비상계엄 사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한걸음에 달려간 시민들과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 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헌법재판소에 소추됐고, 4개월여간 많은 국민들이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을 떠올리며 공포와 불안에 밤잠을 설쳐야 했다.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성으로 격돌했고 분열했다. 보수 진영의 강경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초유의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야말로 정상 대 비정상의 싸움이 노골화했다.
한때 헌재의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판결이 미뤄지자 민주주의 수호층의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헌재 재판관 8인은 증명해 보였다.
다시 원점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새 지도자를 뽑는 조기 대선 국면이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차기 대권을 향한 본격 레이스도 시작됐다. 6.3 대선은 국정농단과 불법내란으로 불명예 종식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다.
야권에서는 일찍부터 유력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내부 경선에서 독주하는 모습이다. 향후 대통령에 오른다면 그에게 덧씌워진 비호감 이미지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나라를 파국으로 몬 민주주의 파괴 세력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정리, 이후 나라의 안정과 경제회복, 국민통합도 당면 과제다.
여권의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윤의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윤을 두둔하며 외눈박이 정치에 빠져 국민과 괴리된 내란동조당의 오명을 씻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토리 키재기하듯 앞다퉈 나온 후보의 면면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윤석열과 단절하고 기존 강경 보수층에 대한 거리두기 및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후보만이 6.3 대선에서 이재명과 싸워볼 만한 대항마가 될 것이다.
단언컨대 여야 막론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우물 안에 갇힌 정치인은 차기 이 나라의 지도자,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 여의도에 정치인이네 하는 자들을 보면 진영 논리와 자당 이기주의, 알량한 금배지 하나 쟁취하기 위해 급급한 자들이 다수다. 그들의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허울 좋은 수사이자 가식이고,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하루살이 위선정치에 불과하다.
차기 대통령은 정적을 향한 정치보복보다는 대연정과 포용을 우선한 상생의 정치를 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내전에 가까운 한국정치의 묵은 과제인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통합형 리더가 돼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권력으로 오판하지 않고, 스스로를 나직이 내려놓고 나라와 국민에 서비스할 줄 아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래야 매번 반복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비로소 종식될 것이다.
결국 만사의 이치가 그렇듯이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시대와 불화하고 고집과 불통, 독단의 정치를 일삼는 독불장군식 제왕적 대통령은 사라져야 한다.
[저작권자ⓒ today1, LawyersI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